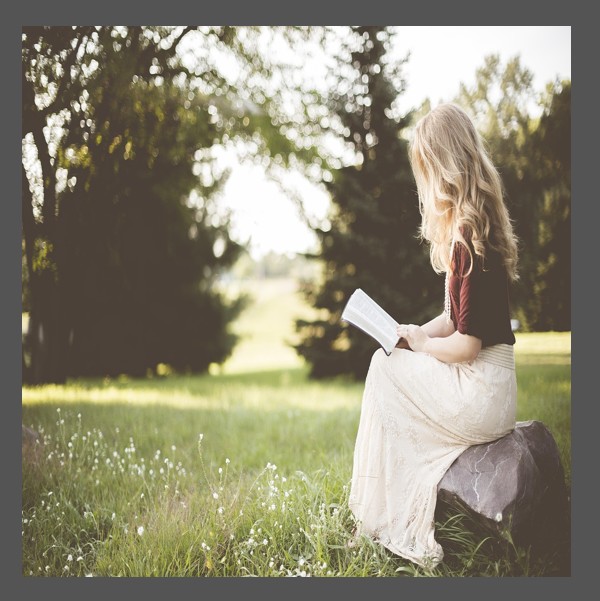
막막한 질투가 나에게 막막하게 다가온다
문을 연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적막한 고요가 나를 맞이한다.
무언가 짙은 감정이 집 안 구석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아무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적막함은, 처음엔 너무 낯설었다.
다른 사람의 흔적 하나 없는 이 공간이
이토록 조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그건 내 마음속까지 정지시키는 듯한 침묵이었다.
누군가는 이 집을 작고, 단조롭고, 지루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이곳은 하나의 울타리,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작은 세계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나뭇잎들이 얇게 흔들리고,
햇살은 커튼 사이로 조심스레 스며든다.
이 사각형의 방 안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내 속도로, 내 감정대로 흘러간다.
혼자 사는 삶은, 나를 더 잘 들여다보게 한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2년째.
그때 나는 지금보다 더 어렸고, 조급했고, 불안했다.
가장 두려웠던 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 고요는 외로움보다 더 묘한 감정을 줬다.
어쩌면 '막막한 질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구에게 질투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선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라디오를 켜두고, 드라마를 틀고,
소리로 침묵을 덮으려 했지만
그건 오히려 내 안의 불안을 키울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이 방 안에서, 나는 조금씩 나를 이해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늘 신경 써야 했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대방의 감정을 앞세우느라
정작 나는 내 마음을 묻어두고 살았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그 어떤 눈치도 필요 없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좋아하는 꽃을 꽂아두고,
감정이 올라오면 아무 이유 없이 울어도 된다.
숨기지 않아도 괜찮은 곳.
이 집은 조용히 그렇게 나를 안아준다.
나를 돌보는 작은 루틴들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이 생활 속에서
나는 나를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웠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청소를 미루면 금세 먼지가 쌓인다.
몸이 아플 땐, 약국에 혼자 가야 하고,
마음이 아플 땐, 내가 나를 다독여야 한다.
이불을 털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내가 좋아하는 향의 디퓨저를 교체하는 일.
그 사소한 루틴들이
내 하루의 숨구멍이 되어주었다.
나를 닮아가는 집
집은 결국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내 집은 따뜻한 조명이 감싸고 있고,
몇 권의 책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햇살이 머물다 가는 창가엔 커피 잔의 그림자가 일렁인다.
화려하진 않아도,
그저 나답게, 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
여기서 나는 비로소
진짜 숨을 쉰다.
조용한 집이 들려주는 말
"오늘도 고생했어."
"넌 잘하고 있어."
"내일은 더 괜찮아질 거야."
아무 소리도 없지만,
가끔 이 집이 그렇게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다.
사실은,
내 안의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어릴 땐 ‘혼자’라는 말이 외로움 같았지만,
지금은 안다.
혼자일 때만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고,
그 말들은 세상 어떤 위로보다도 깊이 다가온다는 걸.
이 집은, 나의 감정을 비추는 거울
불안한 날엔 집도 어질러지고,
평온한 날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인다.
커피잔 하나, 햇살 하나에도 위로받는 순간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건,
단순한 독립을 넘어선
감정의 자립이다.
나는 이 조용한 집을 통해
세상과 나 사이의 거리,
그리고 나와 내 감정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조절해가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
마무리하며
이 말 없는 집에서
나는 매일 나 자신과 조용히 대화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 공간은 나를 비추고,
내 마음을 이해하며
부드럽게 나를 감싸준다.
조용한 이 공간 속에서,
가장 진실한 나 자신이 살아 숨 쉰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곳은 정말,
나의 집이다.